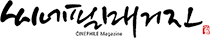카메라의 시선이 지나는 지점들에 관하여
건물의 횡과 종을 유영하는 <발코니의 여자들>의 오프닝 시퀀스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1954)>과 닮았다. 부유하는 카메라가 멈춰 선 곳은 어디인가? <이창>의 카메라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프(제임스 스튜어트)의 두꺼운 깁스를 포커싱한다. 주인공 제프는 창(窓)을 두고 닫힌 안에서 열린 밖을 관음하는 은둔자이자 몸을 숨긴 목격자다. 이와 달리 <발코니의 여자들>의 시선은 밖을 향하며, 나아가 그들의 걸음은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또 하나의 벽을 넘는다.
![[이창(1954) 오프닝 스틸 컷, 사진 = Roger Ebert]](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0_1978_1549.png)
데니스에서 여자들로: 수미상관식 여성 해방학
<발코니의 여자들>의 카메라는 어디에 멈춰서서 누구를 포착하는가? 오프닝 시퀀스는 영화 전체의 ‘복선’이자, 그 자체로 ‘작은 영화’다. 흑인 여성(데니스, 나데지 부숑 지안)이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누워있다. 카메라는 이웃집들과 달리 발이 쳐져 있는 발코니의 창살 틈으로 마치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데니스의 눈을 클로즈업하고, 머지않아 그녀는 가정폭력범인 남편의 머리를 삽으로 쳐 살해한다. 데니스의 행선지는 세 여자의 발코니다. 그녀는 우연한 사고로 남편이 죽었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부탁하고, 여자들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쾌한 웃음을 터뜨린다.
<발코니의 여자들>의 카메라가 제3의 인물을 경유해 비로소 여자들에 도착한 까닭은 무엇인가? 데니스는 ‘이어달리기의 계주’로서, 종속적인 삶에서 주체적인 삶으로 건너가는 바톤을 넘긴다. 뜨거운 여름, 마르세유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 자리한 ‘니콜’과 ‘루비’, 그리고 ‘엘리즈’가 다음 주자들이다.
여자들은 주차 사고를 계기로 가까워진 건너편 이웃 ‘마냐니’의 집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파티 끝에 사진 촬영을 위해 혼자 남은 루비가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마냐니를 살해한 것. ‘남성을 위로하는 게 네 직업이니 응당 나와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성범죄자를 살해하고 여성들이 단결하여 범죄를 은폐하는 응징의 방식은 데니스로부터 계승되어 블랙 코미디적인 방식으로 여성 해방의 계보학을 구축한다.
![[발코니의 여자들 스틸 컷, 사진 = 그린나래미디어]](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0_1981_1957.jpeg)
가슴, 성기, 그리고 카메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선승인 청원유신(靑原惟信) 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통용된 고사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랬던가, 존재하는 사물에서 있는 그대로 본질을 깨닫는다는 고사에서 영화를 본다. 이 영화의 카메라는 노출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거기 있을 뿐이므로 찍는다는 '리얼리즘으로서의 몸'이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육감적이지 않은 가슴과 성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카메라는 엘리즈가 산부인과 진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린 채 의사를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을 컷 전환이나 클로즈업 없이 담담히 프레임에 담는다. 무수한 학위보다 자녀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신 중지를 결정한다. 마릴린 먼로 가발을 뜯어내듯, 부부강간을 일삼고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하는 가부장의 전신, 의처증 남편 폴의 그림자를 탈피한다.
스크린에서 여성의 가슴은 볼거리였고 심미적 오브제였다. 영화는 관조적 쇼트와 잦은 빈도의 포착을 통해 가슴을 손과 발 같은 상대적 비가시성의 영역으로 치환한다. 루비의 발코니 노출씬과 호텔에서 뛰쳐나와 해변가를 거니는 엘리즈의 한쪽 가슴, 그리고 셔츠를 풀어헤친 채 걷고 또 걷는 엔딩 씬의 여성들이 있다.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혹은 옷을 입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여성들의 걸음에는 해방과 연대가 묻어있다.
![[발코니의 여자들 스틸 컷, 사진 = 그린나래미디어]](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0_1980_1558.png)
발코니의 정치: 배제된 신체들이여, 연대하라
다시 제목을 들여다본다. 왜 ‘발코니’의 여자들인가? 발코니는 외부로 돌출된 집의 일부로써 완전한 바깥도, 안도 아니다. 발코니에 선 인물은 때때로 감시, 대상화되며 역으로 세상을 향한 관찰자가 된다. 세상과의 경계이자 중간 지대인 그곳에서, 여성들은 서로의 집을 자처하며 밖으로 나아간다.
발코니의 ‘여자들’로 초점을 옮겨보자. 시신이 든 통을 질질 끌며 거리를 활보하는 세 여자의 모습은 조용한 퍼레이드 같다. 루비가 직업(캠걸)과 별개로 자유의지를 가진 여성임을 상기할 때, 소설가 지망생 니콜이 관음적 짝사랑을 끝내고 기꺼이 우정을 선택할 때, 엘리즈가 아내와 엄마 대신 꿈을 좇는 독립적 인격체가 되기로 할 때, 우리는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과 그 주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범죄를 은폐하고 시체를 처리하며 기꺼이 공범이 되는 끈적한 연대와 단결이야말로 <발코니의 여자들>의 영사기를 돌리는 에너지다. 뜨거운 마르세유의 열기는 세자르 영화제의 아델 에넬을 지나, 피어오르는 서울의 아지랑이가 된다. 2025년 7월, 서울의 한 독립영화관에 엔딩크레딧이 올라가고, 불 켜진 영화관에는 맨 뒷줄에 앉아 박수를 치는 5, 60대 여성들이 있다. 한국을 물들인 정치적 양극화도, 온라인 평론 사이트에서 별 하나와 다섯 개를 두고 벌이는 표창 싸움도 논하고 싶지 않다. 누군가에게 영화는 블랙코미디에서 다큐를 관람하고, 판타지적 결말을 경유해 이윽고 현실이라는 기차역에 내리는 여정이다. [객원 에디터 박하나]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https://www.instagram.com/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