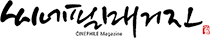혈통과 재능의 간극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01_2444.jpeg)
세상에 단 한 번만 존재할 수 있는 풍경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를 지우며 예술의 근간으로 스며드는 순간일 것이다. 이상일 감독의 영화 『국보』는 바로 그 찰나를 붙잡는다. 가부키의 화려한 장막 뒤, 한 인간의 피와 숨결로 예술이 빚어지는 잔혹한 과정을 응시한다. 영화가 응시하는 것은 성공담이 아니다. 인간이 단 하나의 경지를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끝내 버리지 못한 채 끌고 가는지에 관한 잔혹한 예술의 계보학이다.
<국보>는 가부키의 ‘온나가타’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배우 키쿠오의 삶을 조명한다. 키쿠오는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피로 얼룩진 어둠에서 무대의 빛을 갈망한 존재다. 가부키 명문가의 당주 하나이 한지로에게 맡겨지며 ‘야쿠자의 적자’에서 ‘가부키의 양자’로 상징적 전환을 겪는다. 그 앞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슌스케다. 가문의 피를 온전히 이어받은 장남, 혈통으로는 완벽하지만 재능에서는 키쿠오에게 뒤처지는 존재. 피와 맞바꾼 재능을 얻은 자와, 가문의 피로 보장된 자. 마치 현대판 카인과 아벨을 연상케한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29_1537.png)
서로가 가진 결핍 사이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젊음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청춘을 살아간다. 젊음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화려하다. 가부키의 ‘하나미치(花道), 꽃길)’는 바로 그 찰나의 피어남 속에서 완성된다. 하지만 예술은 결코 그 찰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예명의 세습은 비단 가부키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혈통주의를 압축한 메타포다. ‘하나이 한지로’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인간 위에 다시 덧씌워지는 또 하나의 피다. 키쿠오가 양자로서 그 이름을 잇는다는 것은 혈통이 아닌 “예(藝)”를 통해 가문의 피에 접속하는 일이다. 전통의 논리에서 보면 이는 균열이지만, 예술은 언제나 이런 균열에서 시작된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조심스럽지만 집요하게 파고들며, 전통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과 인간이 예술을 통해 다시 되묻는 것 사이의 긴장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예술은 늘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것을 욕망한다. 만지면 부서지고, 붙잡으면 사라지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하여 예술가는 언제나 세계의 경계에 선다. 인간과 신의 사이, 생과 사의 사이, 무대와 현실의 사이. 그 틈에서 인간은 언어를 잃고, 신은 침묵한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예술은 태어난다. 예술은 신의 침묵을 대신 말하는 인간의 몸짓이다. <국보>는 그 몸짓의 기록이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03_1452.jpeg)
키와메루(極める, きわめる)의 미학
‘키와메루(極める)’라는 단어는 일본 문화의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미학적 신념이다. 무언가를 “잘한다”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태도.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의 삶 일부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납득. <국보>는 이 단어의 잔혹한 얼굴을 중심으로 극중극을 전개해 나간다.
영화 속 가부키 극은 두 개의 축으로 분리된다. 무용과 연극. 연극의 중요한 축인 ‘소네자키 신쥬(曾根崎心中)’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두 남자의 시작이자 결산이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인생이 부딪히며 남기는 파열음이다. 키쿠오가 오하츠를 연기한 첫 ‘소네자키 신쥬’는 예(芸, げい) 그 자체였다. 자신의 젊음을 통째로 불살라, 겨우 한 장면의 무게로 바꾸어 놓는 집요함이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30_1545.png)
이후 슌스케가 의족을 끼고 같은 오하츠로 무대에 서는 장면은 또 다른 의미의 “키와메루”다. 재능의 부족, 혈통의 무게, 실패와 열등감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지고 나오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술 앞에 몸을 던지는 행위. 그것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가 예술 앞에 드리는 최후의 항거에 가깝다.
이 속에서 연기는 고통의 언어이며 기도가 된다. 카메라는 그들을 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흔들리는 붓질처럼, 인간의 숨결이 부서지는 지점까지 밀착한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05_156.jpeg)
무용의 장면들, ‘후지무스메(藤娘)’나 ‘니닌 도조지 (二人道成寺)’는 젊음의 불길이자, 예술의 근원적 광기다. 특히 다나카 민이 연기한 만키쿠의 등장 장면은 경외에 가깝다.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금 인간과 동떨어진 존재감”이었다. 배우의 육체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예술이 인간을 빌려 스스로를 드러내는 찰나의 신화다. 그 찰나, 우리는 “국보”라는 말이 과연 제도적 칭호 이상일 수 있는지를 목격한다.
결국 키쿠오는, 아니 하나이 한지로라고 불러야 할까, 이 경지에 도달한다. 한때 자신을 압도했던 만키쿠의 형상을 자기 육체 안에서 재현해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양자”도, “야쿠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저 한 명의 여형, 한 명의 예술가로서 무대 위에 존재한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3시간의 대장정을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징그러울 정도의 아름다움. 피사체가 아니라 영혼을 찍는 듯, 인물의 호흡과 맥박이 화면의 질감처럼 보인다. 관객은 그 순백의 무희에 매료된다.
이 미학은 일본적 ‘유겐(幽玄)’에 닿아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다 말하지 않기에 더 깊은 것. 모든 인간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절대적 순간, ‘이 한순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숨결에 관한 이야기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31_1551.png)
『국보』의 미학
가부키는 본래 죽음의 미학에서 태어난 예술이다. ‘소네자키 신쥬(曾根崎心中)’는 사랑의 절망 속에서 자결하는 두 연인의 이야기다. ‘백로 아가씨(白鷺娘)’는 눈처럼 하얀 무희가 마지막 춤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서사다. ‘니닌 도조지 (二人道成寺)’ 역시 무용극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질투가 불길로 치환되어 인간을 삼켜버리는 전설이 깔려 있다.
영화의 축이 되는 이 세 작품은 모두 인간의 한계, 욕망, 소멸의 정점에서 탄생한 미학이다. 이상일의 <국보>는 이 연목들을 단지 재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키쿠오라는 한 인간의 생애를 관통하는 축으로 엮어낸다. 살아 있음이 예술의 조건이라면, 왜 예술은 언제나 죽음의 문턱으로 나아가는가. 영화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32_1558.png)
예술은 결국 인간을 지우는 과정이다. 악마와 거래해서라도 얻고 싶은 재능. 그 말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순수한 염원의 언어다. 예술가란 자신이 만든 세계의 불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 불길 속에서, 신의 부재를 깨닫고도 계속 춤춘다.
<국보>의 아름다움은 잔혹하다. 그것은 예술을 위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응시한다. 키쿠오의 삶은 무대 위의 찰나를 위해 전부를 걸고,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예술은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파괴한다. 그러나 그 파괴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살아 있는 ‘생’의 형태라는 말을 하는 듯이. 니체의 말처럼 “예술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정당화”라면, 키쿠오는 그 정당화를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불살랐던 사람이다. 그의 예술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절망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깝다.
![['국보' 스틸 컷, 사진 = NEW]](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11/578_2408_1527.jpeg)
한국인으로서 호기심으로 가부키 무대 같은 영상들을 보아도, 솔직히 의미 같은 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움직임도 우아하다고 할까. 느긋하다고 할까. 그런 여형(女形)의 춤을, 그 아름다움의 뉘앙스까지 세밀하게 포착해낼 수 있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심을 지워버릴 정도로, 요시자와 료의 접신에 가까운 처절한 인생 연기가 있었다. 175분의 러닝타임이 전혀 지겹다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몇몇 장면은 더 오래 머물러도 좋겠다는 욕망을 일으킨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호흡의 길이’로 영화를 감각하게 만드는 배우는 드물다.
간혹 숨을 멈추고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엔드 롤이 흘러나올 때, 모여 있던 모든 호흡이 터져 나와 웃음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무너지는 아름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기묘한 실감을 느끼며, 이런 작품이 투영되는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행운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를 봄에 감사한다. [객원 에디터 이재준]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https://www.instagram.com/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 Patreon: https://www.patreon.com/cw/cinephilemagazine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이론과정>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5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비평입문>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99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수강 신청: https://forms.gle/1ioW2uqfCQGavsZ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