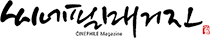덧칠하는 사랑에 대한 공간적 굴레
각자의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사유를 공유하게 될 때 그것은 사랑이 된다. 가끔 타인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이별이란 도착지가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매번, 매순간 다르다. 사랑은 언제 봐도 새롭고, 언제 해도 늘 낯설다. 이 지점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다. 김태양 감독의 <미망>은 '미망(未忘/彌望/迷妄)'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통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남녀의 사랑과 그 진폭을 사유하는 영화다. 이 '미망'에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음', '멀리 넓게 바라봄',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라는 뜻들이 담겨 있다.
<미망>에서의 남녀가 보여주는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은 마치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2024)와 홍상수 감독의 <우리 선희>(2013)를 연상시킨다. 그 이유는 두 작품 모두 남녀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그들의 사랑이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 라이브즈>는 윤회라는 큰 시간적 굴레를 통해 인연 반복을 보여준다. <미망>은 광화문이라는 공간적 굴레 속에서 인연이 반복한다. 반복이라는 지점이 <미망>에게서 <패스트 라이브즈>의 향수가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미망>의 세 파트가 김태양 감독이 사유하는 사랑이 어떠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지 말해볼까 한다.
![[미망 스틸 컷, 사진 = 영화사 진진]](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1_1982_5817.jpeg)
<패스트 라이브즈>는 12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명확히 나타낸다. 하지만 <미망>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직업을 통해 성숙해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 영화의 시작은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며 시작한다. 도착지보다 미리 내려 기억을 더듬으며, 약속장소로 향한다.
이를 통해 우린 알 수 있다. 그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지만,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후에 만나는 여자는 반대이다. 그녀는 도착지는 알지만, 내비게이션을 봐도 길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목적지는 알지만,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다.
두 인물의 엇갈림은 이뿐만 아니다. 여자가 담배를 피려할 때, 라이터를 찾지 못한다. 이때, 남자가 라이터를 사러간다. 그 사이에 여자가 가방 안에서 라이터를 찾아 담뱃불을 붙인다. 돌아온 남자는 빈손이다. 가게에 사람이 없어, 라이터를 사오지 못한 것이다. 둘은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 후에 둘은 횡단보도에서 이별을 고한다. 하지만 빨간불이기에 ―너무 일찍 이별을 고해서― 잠시 뗀뗀한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이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미망 스틸 컷, 사진 = 영화사 진진]](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1_1984_5725.jpeg)
둘이 이동하며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한다. 남자는 그림을 배우고 있고, 여자는 모더레이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둘의 대화를 통해 그림을 그리면서 지켜야하는 몇 가지 수칙을 알게 된다. 틀리더라도 계속 그리기, 선을 여러 번 긋지 말고 한 번에 최대한 길게 그리기, 어떻게든 완성하기.
우리는 이 과정을 들으며 깨닫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다. 동시에 여러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한다.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사랑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별 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한다. 이순신 동상이 왼손잡이인지, 아닌지처럼 어떤 게 정답인지 우린 알지 못한다. 이처럼 사랑이란 미성숙할 때, 특히 많이 고민한다.
이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광화문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전개방식은 무척 흥미롭다. <미망>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 모습을 보면, 시침과 분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광화문 안에서 두 인물이 반복적인 엇갈림을 보여줌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묘사한다.
![[미망 스틸 컷, 사진 = 영화사 진진]](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1_1985_5736.jpeg)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이것이 더욱 자세히 포착된다. 또 다른 사랑, 팀장과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 인물은 영화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첫 번째 파트에서 보인,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남자와 여자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둘이 잘 맞는 커플이라는 것을 알 게 된다. 담배가 없는 팀장과 불이 없는 여자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이다.
하지만 팀장의 가정사와 여자의 가정사로 인해 둘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나는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둘이 헤어지는 지점은 ‘종각역(鐘閣驛)’이다. ‘종각역’에서의 ‘종(鐘)’은 시계를 뜻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망>은 시간에서 시계바늘을 연상시키는 묘사가 많이 존재한다.
‘종각역’에서 종각은 정각과 비슷한 발음을 낸다. 정각이라는 것은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순간이다. 이를 통해 팀장과 여자가 만나는 것을 묘사한다. 즉, 둘은 서로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이자, 잘 맞아떨어지는 톱니바퀴 같은 커플임을 뜻한다.
![[미망 스틸 컷, 사진 = 영화사 진진]](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81_1986_5749.jpeg)
세 번째 파트는 장례식장에서 시작된다. 각 인물의 이동 수단도 상징적이다. 여자가 탄 택시는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고, 남자의 버스는 도착지를 알 수 없다. 사랑의 시작과 끝을 누가 선택했는지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는 장치다. 마지막 버스의 버저 소리는, 그가 자신의 사랑의 종지부를 찍는 듯하다.
사랑은 그림과 같이 덧칠의 과정이다. 전에 했던 사랑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나’가 존재하게 된다. <미망>에서 놀라운 점은 사랑의 방향성이다. 대부분은 사랑을 직선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사랑을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방향이 원을 그리는 있어, 다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한다. 사랑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다. 우리는 시침과 분침처럼 스쳐 지나가며 만나고, 이별을 통해 조금씩 무뎌지고 성숙해진다. 사랑은 결국 그렇게 돌고 도는 시간의 궤적이다. [객원 에디터 이성은]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https://www.instagram.com/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