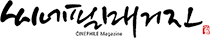다양한 K-POP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요즘의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홍보 영상’을 넘어, 하나의 감정 서사를 품은 시청각 예술로 진화하고 있다. 단편영화처럼 구조화된 이 짧은 영상들은 이제 영화적 언어로 읽힐 필요가 있다. 물론 “뮤직비디오를 영화라 부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장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지금, 그 모호한 접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뮤직비디오와 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MEOVV - ‘TOXIC’ M/V, 사진 = THEBLACKLABEL 유튜브]](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76_1972_4831.png)
TOXIC – 미야오(MEOVV) : 검은 빛과 하얀 독
빛은 언제나 구원의 상징일까. 미야오(MEOVV)의 〈TOXIC〉 뮤직비디오는 이 관념적인 믿음에 조용하고도 단호한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와의 관계,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독성으로 바뀌는 지점, 그 경계 위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이 곡은 포착하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빛은 더 이상 구원의 표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조명이며, 어둠은 그로부터 잠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작동한다.
영상은 멤버 수인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마치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몸짓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내 수인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한다. 이 직면의 순간이야말로, 빛의 아이러니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뮤직비디오는 고전적인 상징어인 ‘빛과 어둠’을 단순히 대비시키지 않는다. 거울이나 유리의 반사, 흑백의 프레임 전환, 카메라의 시점 이동 등을 통해 경계에 선 인물의 위태로운 정서를 시각화한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호해지는 그 경계에서, 빛은 때로 진실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수인은 다시 어둠 속으로 회귀하다가 또다시 빛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은 파멸일지라도 멈출 수 없는 중독적인 감정인 사랑의 은유이다. 〈TOXIC〉은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끌려가게 되는 감정의 본질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늘, 빛과 어둠이 얽힌 어느 틈에서 시작된다.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도 명확한 정서적 전개와 미장센으로 인물을 감정의 한복판에 놓는 이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음악 영상 그 이상이다.
![[ILLIT (아일릿) 'bomb' Brand Film (little monster MV), 사진 = HYBE LABELS 유튜브]](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76_1973_4847.png)
little monster – 아일릿(ILLIT): 동심이라는 마법
어린 시절 누구나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괴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서웠지만 어쩔 때는 친구 같기도 했다. 아일릿(ILLIT)의 뮤직비디오 〈little Monster〉는 그런 동심의 감각을 정확히 포착해낸다. 여기서 마법이란 손에서 불꽃이 튀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법에 더 가깝다.
뮤직비디오 속 괴물들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친근하고 귀엽고 주인공들과 자신만의 놀이들을 이어 나간다. 그게 바로 동심의 마법이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놀이터를 만들어낸다.
눈에 띄는 것은 색감과 연출의 이중성이다. <little Monster〉는 밝고 포근한 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쓸쓸함이 스며 있다. 이는 이들의 감정이 단지 행복이나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심은 한낱 유치한 감정이 아니다. 때로는 어른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놀이처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뮤직비디오는 그런 감정의 이중성을 은은하게 포착해낸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의 방향은 명확해진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각자의 감정을 상징하는 작은 괴물들과 함께 서로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함께 뛰놀며 웃는다. 혼자만의 상상이던 세계는 모두의 놀이터로 변한다.
〈little Monster〉는 묻는다. 우리가 잃어버린 동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단지 순수함이나 무해함이 아닌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자 나쁜 감정조차 놀이로 바꾸는 힘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어쩌면 이 뮤직비디오는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작은 괴물들을 다시 부르는 마법일지도 모르겠다.
![[tripleS(트리플에스) '깨어' (Are You Alive) Official MV, 사진 = tripleS official 유튜브]](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7/476_1974_5027.png)
깨어 – 트리플에스(tripleS): 연대가 공명이 되는 지점
집은 누구에게나 안전지대일까. 누군가에게 집은 안식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다. 트리플에스(tripleS)의 뮤직비디오 〈깨어〉는 그 위태로운 경계 위에 놓인 소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뮤직비디오는 처음부터 불안하다. 멤버들의 얼굴엔 흉터가 있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만든 총을 머리에 겨눈다. 깊은 물에 자신을 던지는 장면, 아파트로 이루어진 감옥을 연상하게 하는 군무 장면은 가정폭력이라는 감정의 지층을 암시한다. 집은 더 이상 안락함의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깨어〉는 이 감금의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던 소녀들은 서로를 서로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함께 춤추며 점차 자신만의 빛을 찾아간다. 연대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지 않는 건, 이 장면들이 감정의 진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트리플에스(tripleS)는 소셜 소녀 사운드(SOCIAL SONYO SOUND)의 약자다. 이들은 K-POP의 반짝이는 조명이 미처 비추지 못한 그림자 속 소녀들을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 모두를 깨워주는 공명이 되어 퍼져나간다.
이 세 편의 뮤직비디오는 단순히 음악의 부가적인 영상물이 아닌 분명한 서사와 미장센 감정의 흐름을 지닌 작은 영화다. 〈TOXIC〉은 빛과 어둠이라는 고전적 상징을 전복하며 자기파괴와 사랑의 경계를 탐색하고, 〈little Monster〉는 동심의 이중성과 상상력을 통해 감정을 재구성하는 힘을 보여주며 〈깨어〉는 억압에서 연대로 나아가는 감정의 공명을 춤과 시각 언어로 표현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의 감정도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뮤직비디오는 더 이상 음악의 종속물이 아니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진한 감정의 잔상을 남기며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의 경계를 조용히 넘어선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새로운 예술의 형식이 태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뮤직비디오를 단지 ‘음악의 시각화’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시청각적으로 직조하는 하나의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적 관점은 이 새로운 형식을 더 깊이 읽기 위한 필연적인 시선이 된다. [객원 에디터 강인]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