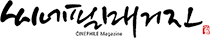기술적 성취를 무색하게 하는 무리수의 연발
"선전은 본질상 일종의 예술이다. 그리고 선전원은 엄밀한 단어상 의미에 있어 민중 심리 예술가라고 볼 수 있다."
-나치 독일 제2대 총리 및 초대 국민계몽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
(괴벨스는 나치즘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영화 제작을 장려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비상선언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5/255_867_4115.jpeg)
단도직입적으로, 영화 비상선언은 한재림 감독의 영화 중 가장 실망스러운 영화일 뿐만 아니라 기획 의도가 상당히 불순해 보이는 영화다.
영화의 초중반은 상당히 고평가할 만하다. 임시완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캐릭터를 순전히 본인의 연기로 살려내 관객의 몰입을 돕는다. 다른 배우들도 흠잡을 만한 연기를 보여주지 않고, 중반부 비행기가 추락하며 내부가 뒤집어지는 장면과 송강호 배우가 맡은 '인호'의 추격 장면은 길진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카메라 워크를 보여주었다. 전도연 배우와 박해준 배우가 연기한 인물들이 설정상 정부를 대변하는 중요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량 대비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화는 중반부까지는 깔끔하면서도 서늘한 블록버스터 스릴러 영화로서 손색이 없다.
![[비상선언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5/255_868_4155.jpeg)
하지만, <비상선언>은 과욕을 부린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부조리극을 만들면서도 항공 재난 블록버스터를 제작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수를 둔다. 영화 속 비행기는 목적지인 하와이에 착륙 거부를 당한다. 그 이유는 임시완이 맡은 '류진석'이 살포한 바이러스로 인해 승객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미국 하와이에 도착하면 본토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미국의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외부로 나오지만 않으면 감염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작 중 어떤 캐릭터도 하지 못한다. 이 생각은 다름 아닌 (코로나 시대를 겪은) 관객이 한다. 관객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관객의 몰입감이 완전히 깨져버린다.
두 번째 무리수는 관객을 실성하게 만든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선언을 외치며 착륙하려는 민간 항공기에 일본 자위대가 출격해 경고사격을 가한다. <비상선언>의 비행기가 모두에게 버려지고 고립된다는 점을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전개로 얄팍한 반일 정서를 자극하려는 게 눈에 쉽게 띈다.
![[비상선언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5/255_869_4222.jpeg)
마지막 무리수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한국 국내 착륙 반대 시위를 하고, 국민 여론 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으로 둔갑한 작위적인 전개가 난무한다. 이런 점이 더더욱 불쾌한 것은 영화가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비상선언'의 비행기에 은유하려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은근슬쩍 무책임한 태도로 들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는 관객들을 향해 묘한 선동을 시작한다. 바로 '집단주의'다.
국내 착륙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내의 여론이 좋지 않자 우물쭈물 대던 정부의 상황을 눈치챈 비행기 승객들과 이병헌이 맡은 '박재혁'은 결국 착륙을 포기한다. 그리고 연락 두절 상태로 하늘 위로 떠난다. 이걸 숭고하게 연출한다. 다시 말하지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숭고하게 연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집단주의이자 전체주의다. 이런 메시지는 부조리하게 연출되어야 효과적이다. 대표적으로 김성훈 감독의 '터널'이 그랬다. 하지만 '비상선언'은 집단주의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자폭한다. 그 와중에 1998년 할리우드 영화 아마겟돈을 연상시키는 신파 영상 통화 장면은 덤이다.
![[비상선언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5/255_870_5014.jpeg)
결국 영화의 중반부 이후의 무성의한 각본, 억지로 지어내는 자극적인 전개,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어쭙잖은 은유, 기괴하게 뒤틀린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과 맞물려 영화를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결론적으로, 중반까지는 정말 재밌게 봤기에 더욱 아쉬운 영화다. 충분히 잠재력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으나, 기획의 한계에 부딪혀 그것을 발산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실책으로 보인다. [영화감독 김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