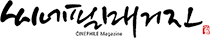우연히 시작된 비극, 상상보다 거대한 파국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단지 잘살아보려 했을 뿐인 노력이 상실로 뒤바뀌고, 상실은 복수심으로 불탄다. 죽고, 죽인 끝에 닿은 것은 내가 그를 죽였기에 돌아오는 복수뿐이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남기기 위한 복수였을까.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스틸 컷 ]](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302/88_151_3022.jpg)
아픈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 류. 누나를 살리기 위한 류의 갖은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그도 모자라 그 기회마저 빼앗는다. 여자친구 영미의 제안으로 부유한 집의 딸을 납치해 돈만 받고 딸은 안전히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지만, 이를 알게 된 누나는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마저 사고로 죽는다. 류는 누나를 살릴 기회를 빼앗은 이들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그러나 같은 시각, 딸아이를 잃은 아버지 동진도 복수심에 류와 영미를 찾기 시작한다.
<복수는 나의 것>은 복수극이지만, 여느 복수극과는 조금 다르다. 통쾌하게 복수하는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모든 게 잘 해결된 해피엔딩을 보는 것이 보통의 복수극이라면, 이 영화는 관객이 끝까지 마음 놓고 통쾌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인신매매단은 작중 유일하게 온전한 악역이다. 류에게 사기 쳐 돈과 신장을 빼앗고, 마취한 여자를 강간하는 데다 동정할만한 서사도 없다. 그러나 죽어가는 남자가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통쾌할 뻔한 복수가 말 못 할 찝찝함으로 변한다. 굳이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거나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여주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들에 대한 얇은 동정심이 스멀스멀 피어나, 복수를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류는 그들의 신장을 꺼내 먹는다. 단순히 먹기만 했다면 모를까, 소금까지 찍어 먹는다. 생활감 있는 공간에 당연하다는 듯 소금에 찍어 인육을 먹는 모습이 주인공과 관객 사이의 몰입을 깨트린다. 마치 몰입에서 깨어난 관객에게 “멋있는 폭력은 없다.”고 말하는 듯하다.
![[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포스터 ]](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302/88_152_3115.jpg)
이 일련의 복수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누군가를 위한 폭력이 아니다. 상실을 채우고, 화를 풀기 위한 폭력이다. 누구도 죽은 사람을 운운하며 변명하지 않고, 죽은 이들이 기뻐할 것 같으냐고 말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상대를 괴롭게 죽이기 위한 행위이기에 그들의 모습에는 낭만도 없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류를 죽인 동진은 류의 시체를 토막 내 묻으려 한다. 자수하거나 자포자기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영화 속 세상은 동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미의 동료들에게 죽음으로써 홀로 성공하게 두지 않는다. 복수의 굴레에 들어온 이상 얻기만 할 수는 없다.
류와 동진조차 결백한 피해자가 아니다. 사연이 어찌 됐든 류는 동진의 딸을 납치했고, 죽게 했다. 동진은 딸이 납치되기 불과 며칠 전, 정리해고된 직원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해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원한 가질 사람이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두 사람 모두 그럼에도 나름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를 거듭할수록 그마저도 잃는다. 아이를 납치하는 것조차 나쁜 일이라며 반대하던 류가 잔인하게 대담하게 사람을 살해한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할 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던 동진이 류의 누나를 부검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 잔인하고 무감각한 범죄자가 될 때까지, 분노가 인간성을 잡아먹었다.
사실 박찬욱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은 좀 더 평범할지 모른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무자비한 복수와 대리만족. 하지만 폭력의 추함을 감추지 않기에, 그들이 선택하는 복수의 방법이 절대 평범하지 않기에 오히려 복수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행복할 수는 없었을까. 분노하라고 밀어 넣는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순 없던 걸까. 동진과 류, 류의 누나, 영미까지,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는 결말이다. [ 영화감독 정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