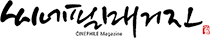복수의 연쇄 속에서 사라지는 경계, 인간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영화는 선과 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책임감 속에서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주인공 류(신하균)는 청각 장애인으로, 장기매매단에게 사기를 당한 후 급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괴를 감행한다. 반면, 동진(송강호)은 유괴된 딸을 되찾으려 하지만 결국 딸을 잃고, 복수를 실행한다. 이후 동진이 죽인 영미(배두나)의 조직원들은 다시 동진에게 복수를 하면서, 복수의 연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복수는 나의 것 스틸 컷, 사진 = CJ ENM MOVIE]](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3/402_1689_2232.jpg)
일단 첫째로, 장애인의 가족은 기본적인 일상에서조차 책임감을 강요당한다. 조금 차가운 말일 수 있지만, 장애인을 챙기는 가족 구성원들은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가족보다 선한 인물들일까?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는 선함의 정도와 관련이 없다. 앞서 말했듯, 반강제로 요구되는 ‘책임감’이 주고, 그 외의 선함은 결국 개개인의 차이이다. 류가 장기를 구하려 한 것도, 복수하려 한 것도, 유괴를 한 것도 그 기저에는 ‘누나’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을까.
둘째로, 내 ‘책임’이 아닌 일에는 모두가 이성적일 수 있다. 유선의 유괴살인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는 동진과 애기하다가 차 밖에서 전화를 받으며 “우리 집은 그나마 다행이야, 돈이 없으니 유괴당하거나 하지도 않고…”라는 등 당사자와 굉장히 가까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 그럼 동진이 덜덜 떨고 몇 번을 망설이면서도 결국 류를 죽이는 건 무엇 때문일까. 아마 류처럼 유선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복수는 나의 것 스틸 컷, 사진 = CJ ENM MOVIE]](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3/402_1690_2248.jpg)
결국 이 영화의 중심에는 ‘책임감’이 있다. <복수는 나의 것>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을 조명하는 것이다. 동진이 류를 죽일 때 주저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단순히 감정을 배제한 복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영화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또한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책임감과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 개념이 드러나기도 한다. 나치 전범 아이히만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듯, 영화 속 인물들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동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변모한다.
![[복수는 나의 것 스틸 컷, 사진 = CJ ENM MOVIE]](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3/402_1692_2425.jpg)
지금 우리는 동진의 옆에서 전화를 받는 형사처럼, 그 ‘악’이라는 걸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극 중 모두는 주어진 상황 속에 자신의 책임이라 느껴지는 것들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이다. 누가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가, 누가 자신의 딸이 유괴당해서 시신이 되어 돌아올 거라 예상하는가. 혹은 누가 본인의 보직이 유대인을 학살하기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예상하는가. 어느 누구도 특정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선과 악을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무엇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복수는 나의 것>은 관객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가해자’이고, 누군가는 ‘피해자’일까? 영화는 이러한 도덕적 질문을 던지며, 선악의 절대성이 허상임을 강조한다. 박찬욱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철학적 깊이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치밀한 탐구이자,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영화감독 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