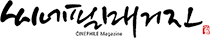알 수 없는 불편함에 대한 영화적 표현
찰리 카우프만 감독의 영화 <이제 그만 끝낼까 해>는 내용을 요약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특별히 중심이 되는 사건이 없을뿐더러 명확한 기승전결도 없다. 관객은 주인공을 스쳐 가는 자잘하고 많은 사건 속에 함께 유기되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끌려다녀야 한다. 통일성과 서사성이 해체되어 있고, 길고 긴 대사에는 의미가 없고, 어느 인물도 납득할 만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영화에는 영화라면 흔히 가지고 있을 법한 뼈대가 거의 없다. 그 대신 뼈대가 없을 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상을 지닌다.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3/211_682_754.jpg)
주인공은 항상 불안에 차 있다. 남자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지만, 주인공은 거기에 대한 설렘도, 걱정도 없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고, 더 정확히는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자신이 가진 불안을 참기도 벅차다. 남자 친구와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화라기보다 각자의 독백에 가깝다. 주인공은 남자 친구의 말에 꼬박꼬박 대답하지만, 그 내용에 관심 없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는 남자 친구의 의견도, 반응도 신경 쓰지 않는다. 주인공에게 이 대화는 불편하다. (결별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 친구와 단둘이 있는 이 폐쇄적인 공간이 불편하다. 적막한 창밖 풍경을 보며 느끼는 짧은 침묵이 차라리 마음 편히 느껴진다.
둘이 함께 타고 가는 차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다. 가까운 관계가 주는 불편함, 그걸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느끼는 갈증. 이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없다. 남자 친구는 상냥하고, 배려심 깊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싸울만한 일도 없다. 그렇지만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은 선명하다.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3/211_683_434.jpg)
남자 친구의 집은 남자 친구의 자기혐오가 가득하다. 그는 부모님을 대놓고 싫어한다. 농장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주인공이 부모님과 만나지 못하게 빙빙 돌리고, 막상 만나러 가서는 부모님이 내려오지 않자 초조해한다. 2층으로 올라가 모시고 나올 수 있으면서도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과 초라하고 독선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한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과 긴 세월 속에서 독선적으로 변해버린, 단점 가득한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남자 친구는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자신이 그들의 아들이라는 혐오감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연민한다. 어릴 적에는 든든하고 멋졌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도 이제는 그 모습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초라한 노인들을 가엽게 여긴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불안해한다.
영화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를 분명히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원인을 모르니 고칠 수 없다. 주인공은 불안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남자 친구는 주인공을 놓아주지 않는다. 남자 친구도 마찬가지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자기혐오와 부모에 대한 연민,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외면하려 한다.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스틸 컷]](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403/211_684_723.jpg)
이 영화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인물 사이 단절된 소통,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장면의 배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흐름으로 막연하고 거대한 감정들을 가시화하고, 직접 느끼도록 한다.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안과 불안이 가져오는 답답함만큼은 불안을 표현하는 어떤 말보다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이 작품이 이야기로써 재미가 있느냐 하면 아니다. 영화만 보는 것으로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이야기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도 없다. 하지만 영화로써 보면, 이 영화는 재밌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롭고 독특한 전개 방식이나, 인물의 단점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감독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한 깊은 성찰이 보인다. 관객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영상 연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이지 않을까 싶다. [영화감독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