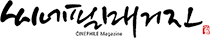상대를 속이는 행위
![[씽씽 스틸 컷, 사진 = 오드]](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9/533_2188_3745.jpg)
연기와 사기의 차이가 무엇이냐. 둘 다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행동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이를 배우라 한다. 배우(俳優)에서 배(俳)를 살펴보면, ‘사람 인(人)’에 ‘아닐 비(非)’가 함께 있다. 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타인의 모습으로 변함을 뜻한다. 사기꾼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처럼 연기와 배우. 사기와 사기꾼. 둘의 차이는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다.
우리는 <씽씽>에서 디바인 G와 디바인 아이라는 캐릭터를 바라본다. 디바인 G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어왕」,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정통 연극을 연기한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또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햄릿을 연기하고자 한다. 그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연기자, 배우라 생각한다.
디바인 G와 마이크 마이크의 시선으로 본, 디바인 아이의 모습은 사기꾼에 가깝다. 약한 백인에게 사기를 치고 등쳐먹는다. 이어 아무렇지도 않게 「리어왕」의 대사를 읊는 모습을 보고는 디바인 G는 그를 캐스팅한다. 영화의 오프닝에서부터 두 가지의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보여준다. 하나는 연기, 하나는 사기로서 말이다. 연기와 사기의 차이는 의도이다. 상대방을 속인다는 결과가 아닌, 의도라는 과정을 바라보면 둘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씽씽 스틸 컷, 사진 = 오드]](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9/533_2189_3758.jpeg)
교화의 과정
디바인 G와 디바인 아이의 평가는 극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초반 디바인 G의 태도는 선량하다. 그는 리더로서 주변 인물들을 도우려 한다. RTA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디바인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 희극을 하자고 의견을 표출한 것은 디바인 아이였다. 하지만 이내 비극을 하고 싶다고 말을 바꾼다.
디바인 G는 곧 있을 가석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가석방을 확신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질문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모두 연기 아닙니까?” 우리는 영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중반부터 깨닫는다. 디바인 G의 태도가 가식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진솔한 태도는 디바인 아이에게 느낀다.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진솔하다. 그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연극을 훼방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방법을 깨닫자 그는 RTA에 동화된다.
![[씽씽 스틸 컷, 사진 = 오드]](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9/533_2190_3812.jpg)
진실만을 행동한 디바인 아이는 가석방 심사에 통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짓을 행동한 디바인 G는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진다. 그는 지금까지 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속였던 것이다. 그렇다. 그는 진정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시의 방황 이후, 디바인 아이의 진심으로―도움으로, 디바인 G 또한 진실한 태도로서 연극에 참여한다. 이어 가석방 재심사도 통과한다.
<씽씽>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바라보는 영화이다. 단순히 교도소는 징역을 사는 장소가 아닌, 그 안에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말한다. RTA 회원들은 공연 준비를 통해, 사기가 아닌 진정성이 담긴 연기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도소라는 장소의 역할을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설명한다.
![[씽씽 스틸 컷, 사진 = 오드]](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9/533_2192_3932.jpg)
연극이라는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라이브를 통한 감동, 즉 직접적으로 배우가 관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영화는 배우의 연기를 카메라에 담아,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 스크린을 통해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렇기에 연극은 템포가 변할 때도 존재하고, 배우들의 실수도 존재한다. 정제되지 않은 원석 그 자체이다.
<씽씽>은 뉴욕에 있는 최고 등급의,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배우가 아닌, 실제 죄수를 참여시켰다. 걸러지지 않은, 거친 인물을 참여 시킨 것이다. 이 공연을 카메라에 담아,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다. 이는 우리에게 스크린이라는 철창과 같은 안전장치로 보호해준 것이다.
![[씽씽 스틸 컷, 사진 = 오드]](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9/533_2193_3955.jpg)
스크린과 담장이라는 벽
영화는 이처럼 감옥을 영화의 화법으로 표현했다. 감옥이라는 장소는 관객들이 직접 가기 힘든 공간이다. 대체로 감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뉴스,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와 같은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정제된 교도소를 바라본다. <씽씽>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다. 정제되지 않은 연극을, 편집이라는 가공을 통해 스크린으로 관람하게 설계했다.
사회와 교도소는 높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담장은 사회와 죄수 사이를 단절시킨다. 사회와 교도소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교도소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개념이 아닌, 사회에서 교도소를 향한 일방성일 뿐이다. 감시를 통해 그들을 통제하려 한다. 이와 방향성은 <씽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RTA는 자신들이 준비한 연기만을 할 뿐이다. 관객들은 그들의 연기를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관람한다. 그들은 우릴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다.
![[씽씽 스틸 컷, 사진 = 오드]](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9/533_2195_4228.png)
마지막 디바인 G와 디바인 아이의 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객들은 둘의 재회를 차 안에서 본다. 이때 그들의 재회 장면은 무대 위에서의 연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사회와 범죄자들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차 안에서 차 밖의 대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사회로 발을 내딛는다. 디바인 아이가 운전하는 차 안, 조수석에는 디바인 G가 앉아 있다. 그는 창문을 내리지만 끝까지 열지 않는다. 사회와 완전히 마주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필요한 듯하다. 사회와 출소자, 전과자 사이에는 창문이 남긴 틈만큼의 문턱이 존재한다. 그 문턱의 높이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이자, 사회가 던지는 감시의 시선과 그들 안의 선망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결국 우리와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지만, 언제나 어떤 장벽을 사이에 두고 바라본다. [객원 에디터 이성은]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https://www.instagram.com/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이론과정>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5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비평입문>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99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수강 신청: https://forms.gle/1ioW2uqfCQGavsZ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