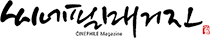오프닝 시퀀스의 절단과 감춤
![[마더 스틸 컷, 사진 = CJ ENM]](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15_2105_037.jpeg)
<마더>는 김혜자가 연기하는 ‘마더’가 넓은 초원의 언덕을 오르는 장면으로 문을 연다. 그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 높이까지 오는 풀이 흔들린다. 이 풀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민중을 상징하는 장치이며, 마더와 동질화된 존재다. 풀밖에 없는 허허벌판에서 마더는 주춤거리다 이내 막춤을 추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가지만, 정면을 또렷이 보여주지 않는다. 허리 아래를 감추거나 손의 움직임을 절제된 프레임 속에 가둔다. 이어지는 타이틀 신에서는 마더가 왼손을 옷깃 안으로 천천히 숨기는 동작이 클로즈업된다. 허리, 손, 얼굴의 일부가 차례로 가려지며, ‘신체 감춤’이라는 은유가 서서히 쌓인다.
곧 등장하는 ‘작두질’ 장면은 이 감춤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한다. 누군가 풀을 작두대로 가져와 세 번에 걸쳐 절단한다. 풀을 내려치는 순간, 화면은 마더의 클로즈업으로 전환되고, 날카로운 서걱 소리가 들린다. 풀의 절단과 마더의 감춤이 연결되는 것이다. 오프닝의 허리 감춤, 타이틀 신의 손 감춤, 그리고 풀 절단과 겹치는 머리의 은폐. 이는 마더의 하체, 손목, 머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듯 상징화된다.
중요한 점은 이 절단의 주체가 외부 권력이 아니라 마더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마더는 스스로를 끊어내며 스스로를 은폐한다. 하체, 손, 머리를 절단해 결국 몸통만 남긴 인물로 나타난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토막 내고 감춘 존재로 시작한다. 곧이어 등장하는 시점 숏에서 마더는 멀리 도준(원빈)과 진태(진구)를 바라본다. 풀을 절단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다시 풀을 자르고, 또다시 내려다본다. 이 반복은 단순한 동작을 넘어 절단의 대상이 마더 자신에서 도준과 진태로 확장됨을 암시한다. 서걱거리는 소리는 냉랭하고 무심하다.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 리듬은 영화 전반에 깔릴 차가운 기조를 미리 전한다.
![[마더 스틸 컷, 사진 = CJ ENM]](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15_2106_19.jpeg)
<마더>의 신체 은유
영화의 서사를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아정(문희라) 살인 사건 후 아들의 결백을 굳게 믿는 마더는 스스로 진범을 찾는다.
둘째,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범행을 목격한 고물상 노인(이영석)을 살해한다.
셋째, 도준 대신 종팔(김홍집)이 체포되고, 마더는 다른 어머니들과 여행을 떠난다.
이 간단한 줄거리는 오프닝의 ‘절단–감춤’ 은유와 정확히 맞물린다. 오프닝의 하체 절단은 ‘진범을 찾기 위한 끝없는 여정’을 감춘다. 타이틀 신의 손 절단은 ‘고물상 노인을 살해한 행위’를 은폐한다. 이어지는 머리 절단은 ‘피가 튄 얼굴,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을 숨긴다. 다리, 손, 얼굴은 수사의 단서와 증거인데, 마더는 그것들을 스스로 끊어냄으로써 완전범죄를 꾀한다.
![[마더 스틸 컷, 사진 = CJ ENM]](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15_2107_133.jpeg)
이 은폐는 영화 후반에 반복적으로 강화된다. 노인의 집을 불태운 장면에서 마더는 시점 숏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데, 곧바로 풀을 자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살인의 흔적을 감춘다’는 상징이 다시금 작동하는 것이다. 도준이 마더의 침 케이스 잔해를 발견하며, 모자는 서로의 죄를 은폐하는 비밀스러운 연대를 맺는다. 봉준호 특유의 알싸한 블랙 유머와 아이러니가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결국 영화는 은폐라는 행위가 마더의 신체 은유와 긴밀히 맞닿아 있음을 반복해 강조한다.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지우고, 진범 대신 다른 이를 희생양으로 만든다. 절단–감춤의 연쇄는 영화의 서사 전개와 구조적으로 겹쳐져 있다.
![[마더 스틸 컷, 사진 = CJ ENM]](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15_2108_143.jpeg)
관계의 연쇄와 망각의 춤
영화 중반, 마더는 진태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진태와 미나(천우희)의 섹스를 목격한다. 두 사람은 끝말잇기를 하며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끊임없는 연쇄’를 은유한다. 주거침입자 마더를 향한 진태의 대사("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냐")는 두 사람의 섹스를 암시한다. 그런 진태는 마더의 아들이기도 하다. 마더를 엄마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인 아들 도준마저 마더와 영화적인 섹스를 한다. 도준은 마더와 “잔다”라는 이야기를 동네방네 너스레 떠들고 다닌다. 다시 말해 도준-마더-진태-미나, 네 사람의 섹스는 끝말잇기하듯 연결된다.
봉준호가 2000년대 그려낸 약자의 비극은 늘 이와 같은 연쇄 구조였다. <살인의 추억>에서 진범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의 사슬이 우로보로스처럼 반복되듯 <마더> 역시 은폐와 절단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고물상 노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불태우고, 도준을 감추기 위해 종팔을 희생시키며, 종팔의 억울한 죽음마저 다시 덮는다. 비극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꼬리를 물며 이어진다.
![[마더 스틸 컷, 사진 = CJ ENM]](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15_2109_155.jpeg)
그러나 영화는 마지막에 전혀 다른 장면을 내놓는다. 마더는 풀 사이에서 춤을 춘다. 춤은 망각의 제의다. 그녀는 허벅지에 침을 놓고, 고통과 슬픔을 잠시나마 잊으려 한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지고, 풀은 더 이상 작두대 위에 눕지 않는다. 풀은 곧게 서서 춤춘다. 민중도 춤춘다. 이제 절단–감춤의 서늘한 리듬 대신 어지럽고도 빛나는 몸짓이 화면을 채운다.
이 춤은 현실의 비극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게 하는 몸부림이다. “너도 여기 숨었니, 나도 여기 숨었어.” 풀 사이의 춤사위는 그렇게 서로의 은폐와 고통을 공유하며 공명한다.
![[마더 스틸 컷, 사진 = CJ ENM]](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15_2110_213.jpeg)
감추고 잘라내는 세계 속에서
<마더>는 약자의 생존 욕망이 일그러진 모성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정교하게 그린다. 오프닝에서 제시된 절단–감춤의 은유는 영화 전반을 관통하며, 사건을 덮고 흔적을 지우는 마더의 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마더는 춤으로 전환한다. 절단과 은폐로 점철된 세계 속에서도, 잠시나마 몸짓으로 자신을 위무하는 것이다.
봉준호는 풀과 민중, 어머니를 겹쳐놓으며 이렇게 말한다. 감추고 잘라내는 세계 속에서도, 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또 다른 방식이며, 모성의 처연한 몸짓이기도 하다. [객원 에디터 송용환]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https://www.instagram.com/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이론과정>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5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비평입문>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99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수강 신청: https://forms.gle/1ioW2uqfCQGavsZ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