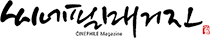속력을 결정하는 목적성
숨이 차오를 때까지 달려본 게 소싯적 일이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하면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엄마의 말에 홀린 듯 달린 기억이 마지막이다. 아쉽게도 핸드폰은 받지 못했다. 그때는 단지 핸드폰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겐 목숨이 목적이 된다.
![[탈주 스틸 컷, 사진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5/441_1850_169.jpeg)
북한의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의 최전방까지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달리기로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는 감시 카메라, 저격총을 든 병사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들이 가득하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선, 죽을 각오로 달리는 기적과 같은 확률에 자신을 걸어야 한다.
영화 〈탈주〉의 주인공 임규남(이제훈)은 전역을 앞둔 북한 병사다. 대한민국 라디오 주파수가 닿는 경계에서, 그는 탈출을 결심한다. 단지 군대가 힘들다는 이유였으면 전역까지 버티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실패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탈주 스틸 컷, 사진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5/441_1851_151.jpeg)
그의 맞은편에는 북한군 소좌 리현상(구교환)이 있다. 현상은 운 좋게도 완장을 찬 채 태어난 인물이다. 그 덕분에 잠시나마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한 경험도 있다. 그의 총구는 규남을 향하지만, 그 총을 쥔 손은 러시아에서 피아노를 치던 기억을 떠올린다.
현상은 규남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하지만 규남을 끝까지 쫓는 그의 눈동자에는 묘한 슬픔이 있다. 그는 어쩌면 실패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기보다, 끝내 실패를 향해 달릴 수 있었던 규남을 부러워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서사의 궤적은 단순하다. 규남은 도망치고, 현상은 그를 쫓는다. 영화는 인물의 복잡한 배경이나 감정에 대한 장황한 설명 없이, 오직 '탈주'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 이 압축적 선택 덕에 관객은 규남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의 생존을 간절히 응원하게 된다.
![[탈주 스틸 컷, 사진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5/441_1854_1542.jpeg)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규남과 현상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은 서사의 도구처럼 보인다. 특히 영화 중반에 등장하는 꽃제비 패거리는 단지 기능만 수행한 채 퇴장하고, 몇몇 장면은 폭력성 그 자체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이기도 한다.
폭력을 다룰 때 필요한 신중함 없이 캐릭터의 잔인함을 강조하기 위한 폭력은, 관객에게 감정을 소모시키는 피로감만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탈주〉의 가장 큰 미덕은 규남의 처절한 달리기를 통해 관객 스스로를 마주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의 전속력 질주는 누군가에겐 지나온 발자국이고, 누군가에겐 앞날의 표상일 수 있다.
![[탈주 스틸 컷, 사진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5/441_1855_1554.jpeg)
리현상이 규남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을 때, 그는 단지 임무 수행자가 아니라, 규남이라는 거울을 마주한 채 서 있는 인간이었다. 총을 쥔 손 너머로 그는 자신이 끝내 달릴 수 없었던 삶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속력을 결정하는 건, 두 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객원 에디터 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