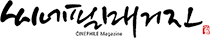꽁치 없는 '꽁치의 맛'
![[꽁치의 맛 스틸 컷, 사진 = IMDB]](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08_2073_594.jpg)
입추를 지나 어느덧 처서를 앞두고 있다. 바닥에 뒹구는 낙엽 없이 가을을 그리는 일은 힘들다. 낙엽을 보고 가을을 연상하지 않는 일도 어렵다. 일본에는 ‘サンマが出るとあんまが引込む(꽁치가 나오면 안마사가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다. 기름이 올라 영양가가 풍부한 가을 꽁치를 먹으면 몸이 튼튼해져 안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재미난 속담이다. 이처럼 가을과 꽁치는 수어지교다.
아이러니하게도 <꽁치의 맛>에는 단 한 번도 꽁치가 등장하지 않는다. 제목에 실재하는 대상이 극에는 부재하는 모순적 방식은 오즈 야스지로의 전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치다. <동경 이야기>(1953)에는 도쿄 전경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만춘>(1949)과 <초여름>(1951) 등에서도 뚜렷한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즈 야스지로는 대상을 노출하는 대신 상징을 극 전반에 포진함으로써, 관객 스스로 공백의 의미를 채우도록 유도한다.
꽁치는 가을의 생선이다. 수명은 1~2년으로 짧고, 회유를 반복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러한 생태는 히라야마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과 조응하며 계절적 회귀는 딸을 시집보내는 가족의 ‘세대 순환’과 맞물린다. 가을은 여름의 생명력을 끌어다 열매를 맺고 이윽고 겨울이 되어 떨어질, 고독함이 침투하는 점령의 계절이다. 원제가 <An Autumn Afternoon>인 까닭이다. 이 과도기는 일본의 시대상에 대한 은유이면서 히라야마의 가족이 해체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표상한다.
![[꽁치의 맛 스틸 컷, 사진 = Slant Magazine]](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08_2075_015.jpg)
오프닝, 다섯 개의 기둥과 침범하는 연기(Smoke)
다섯 개의 기둥이 솟아있는 공장 (혹은 발전소) 사이로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른다. 기둥은 히라야마의 죽은 아내를 포함한 다섯 가족이며 그 사이로 솟구치는 연기는 ‘변화의 유령’이다. 1945년 2차 대전 패전 이후 약 15년, 일본은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960~1973년 국민 총생산(GNP)의 실질 성장률은 10%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은 3.9%, 영국은 3.2%에 불과했다. 일본의 전근대적 가족관 역시 경제 발전에 발맞춰 서서히 변모했다.
히라야마는 장성한 세 자녀를 둔 60년대 아버지로서, 20대라면 마땅히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을 가진 인물이다. 오프닝 장면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 권한다. 그런데 막상 친구 슈조 카와이가 들어와 중매를 제안하자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다’, ‘처녀티도 안 나는 어린애’라며 거절한다. 카와이가 강력하게 어필하자 ‘알겠다’고 일축하지만, 둘째 딸 미치코에게 전하지 않는다. 히라야마는 딸을 시집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흐릿해진 논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이치가 아내 노부코를 위해 오믈렛을 만들거나, 골프채를 사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등의 모습에서 ‘평등한 부부관계’가 그려진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전통적 가족관이 해체되는 양상이다. 중학교 은사 사쿠마의 딸 토모코가 미혼인 것처럼 결혼은 선택의 영역이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당위의 결혼관’과 ‘출가외인의 논리’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점점 짙어지는 히라야마의 고독은 곧 가부장의 시대가 저무는 고독이다.
![[꽁치의 맛 스틸 컷, 사진 = 미디어스]](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08_2076_055.png)
군함 행진곡, 반복과 변주의 의미
오즈 야스지로는 절제되고 정적인 다다미 쇼트를 구사한다. 그 가운데 분위기를 환기하는 터닝 포인트는 단연코 술집에서 군가를 따라 부르는 장면일 것이다. 히라야마는 이곳을 세 번 방문했지만 매번 동행자가 다르고(혹은 없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군가를 틀지 않았다. 이 ‘반복과 변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동행자는 사카모토다. 히라야마는 은사 사쿠마의 라멘집에서 우연히 전 해군 선원 사카모토를 만난다. 그들은 술집에 방문하고, 가게 주인은 익숙하게 군가를 재생한다. 군함 행진곡(軍艦マーチ, 1900)이 디제시스 사운드로 흘러나온다. 다섯 손가락을 딱 붙여 경례하는 히라야마는 2차대전 퇴역 해군 함장 출신이다. 승패와 우위가 시시각각 전복되는 예측불허 난세의 생존자들에게 군가는 젊은 시절을 받쳤던 시대의 향수이자 아버지 세대의 전유물이다.
술집은 과거를 추억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딸의 결혼을 고민·논의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사카모토는 곧 손자가 태어난다는 부푼 마음을 드러낸다. 이 장면은 군복을 벗은 청춘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3 세대를 이루는 시간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친구 카와이, 은사님, 그리고 사카모토가 선행한 세대교체의 다음 주자는 히라야마다. 바통을 이어받은 히라야마는 두 번째 방문에서 아들 코이치와 함께 미치코가 마음에 두고 있는 미우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꽁치의 맛 스틸 컷, 사진 = MUBI]](https://cdn.cinephile.kr/news/photo/202508/508_2079_312.png)
자조적 세대교체식
두 번째 방문에는 그의 ‘외로움’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히라야마는 젊은 시절의 아내를 투영하여 ‘가게 주인이 아내를 닮았다’ 하지만 아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아들은 ‘어머니’로서의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히라야마는 군가를 틀어준다는 주인의 말을 사양한다. ‘죽은 아내와 군가’, 한 세대만이 곱씹을 수 있는 고독한 노스탤지어는 쓸쓸함을 증폭시키고 이 세대교체의 변곡점에서 군가는 재생되지 않는다.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홀로 술집에 방문한 히라야마는 ‘장례식에 다녀왔냐’는 주인의 말에 “비슷한 거죠”라 답한다. 결혼과 장례를 동일선상에 두는 역설적 정서는 씁쓸한 자기고백이자 상실의 단서다. 군가가 흘러나온다. 옆 손님들이 ”본부에서 알린다-"라는 대사를 시작으로 “전쟁은 졌잖아요? 그럼 졌죠.”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장면은 취한 히라야마의 환각이다. 목숨을 담보로 전력을 다한 전쟁에서 패하고, 그보다 더 치열한 삶에서도 진 것 같은 허망함만 남았다.
군가는 현관문을 타고 들어와 미치코가 없는 빈집을 가득 메운다. 첫째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철없는 막내 카즈오는 먼저 잠자리에 든다. “물 위의 철옹성 해 뜨는 그곳에-”, 위무 공연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미치코의 온기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다. 자조적 세대교체식이 끝나고 남은 히라야마의 뒷모습은 가부장 시대가 저무는 풍경이다. [객원 에디터 박하나]
씨네필매거진 공식 인스타그램 @cinephile_mag
https://www.instagram.com/cinephile_mag/
씨네필매거진 객원 에디터 모집: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7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이론과정>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54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비평입문> 안내: https://www.cinephile.kr/news/articleView.html?idxno=499
씨네필매거진 X 서울필름아카데미 수강 신청: https://forms.gle/1ioW2uqfCQGavsZs7